“시간이 흐르면 어떤 죽음은 투어의 대상이 된다. 여행자는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이면서 침범하고 훼손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소설을 쓰며 그 사실을 생각했다.” (작가의 말 201쪽)
재난이 덮친 므레모사를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 자진하여 귀환한 자들을 궁금해합니다. 재난현장을 도망치기에도 바쁠 텐데 오히려 스스로 귀환을 한다는 것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도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므레모사입니다. 단내가 풍기는 도시, 암시가 냄새처럼 퍼진 도시, 그곳은 귀환자들과 방문자들이 공생하는 공간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살해되고, 의심하는 자는 추방되는 도시입니다. 암시에 걸려 바늘에 꿰어 사는 사람들은 전혀 고통을 모르고 탈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므레모사에 사는 사람들을 의심할 게 아니라 방문객들을 다른 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용수 유안은 다리를 잃고 의족을 가졌지만, 그림자 다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때마다 통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림자 다리란 잘린 다리를 말하며, 환지통을 의미하지만, 의족을 인정하며 현실을 사는 것에 대한 반발과 불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당해 대안을 찾아 피난을 했지만, 잃어버린 터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대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환을 택합니다. 귀환자들을 바라보는 외부인은 궁금증으로 현장을 찾습니다만 귀환자들을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얀 천에 덮인 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듯한 표정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재난을 다룬 소설이 아닙니다. 작가가 말했듯이 재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방문객은 자유롭게 침범하고 훼손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현장이었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삶의 현장이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은 과거 살았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방문하여 침범하고 훼손하는 관광객일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한가운데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본 자들은 죽음의 현장이었던 곳에서 삶의 다른 희망을 보며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므레모사의 서사에는 사건으로서 그 일이 벌어진 과거 그리고 지금인 현재만이 있다. 이 두 시제를 오가는 반복에서 발생하는 차이의 역량이 므레모사의 서사를 작동시킨다. 그러기에 이 서사에 던져질 질문은 (중략) 왜 재난을 그토록 재현하면서 반복하려 하는가.” (작품해설 김은주 188-189쪽)라는 작품해설이 동문서답 같습니다. “재난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은 채 왜 반복되어 ‘힘들의 지대’를 만들면서 재현되는가”라는 해설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해설이 다른 소설이 된 듯하기도 합니다. 평론은 작품과는 다른 장르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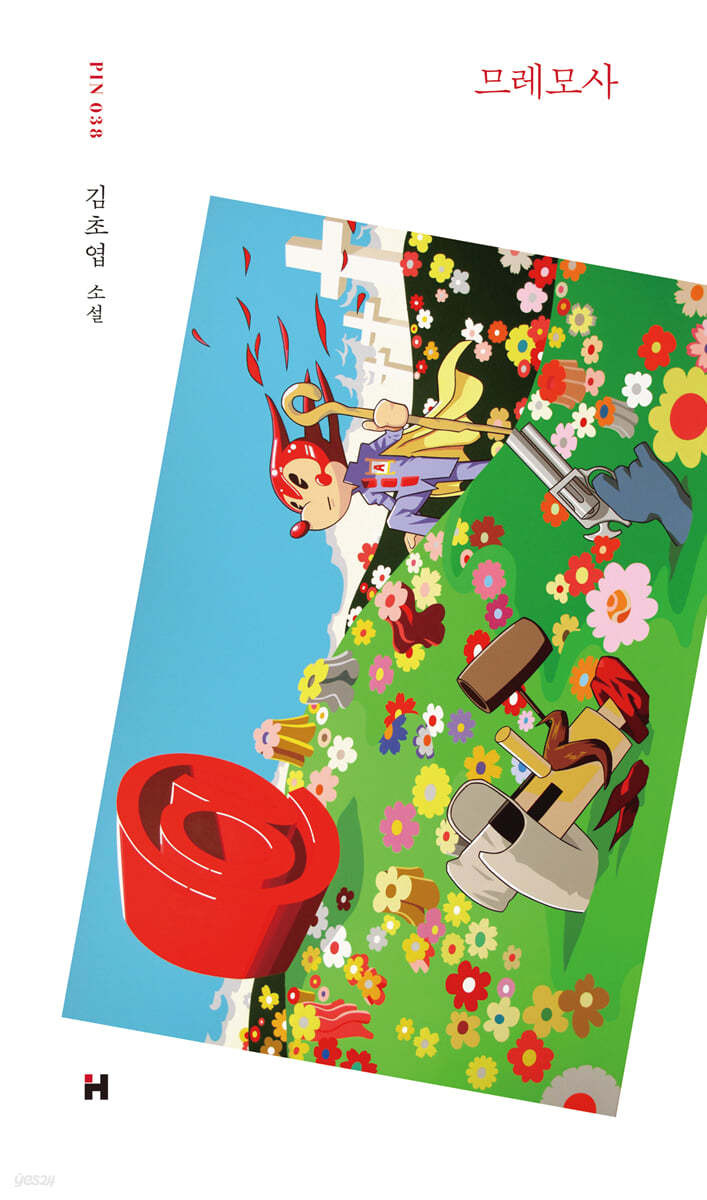
'매일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중 작가 초롱. 이미상 소설. 문학동네 간행 (4) | 2024.12.03 |
|---|---|
| 심여사는 킬러. 강지영 장편소설. 네오픽션 간행 (0) | 2024.11.27 |
| 성소년. 이희주 장편소설. 문학동네 간행 (2) | 2024.11.25 |
| 기억서점. 송유정 장편소설. 다산북스 간행 (0) | 2024.11.22 |
| 해가 지는 곳으로. 최진영 장편소설. 민음사 간행 (1)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