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작소설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등장인물들을 따라가는 데 힘이 덜 들 텐데, 어떤 이야기에도 작가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이 떠나지 않고, 이야기마다 다른 듯,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으면 이야기들을 이어 붙이다가 떼어 놓기를 반복하여 읽고 따라가기 힘이 듭니다. 아무리 따라붙으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절망하는 마라토너가 된 기분입니다. 좋은 코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승민 문학평론가의 작품 해설 ‘혁명의 투시도’가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작가가 천착하는 주제가 저에겐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마치 안(전파)남이 된 듯하였고(334~337쪽) 두 딸을 가지면서 이해했던 페미니즘의 졸렬함이 드러나 괜히 작가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눈초리가 되었습니다. ‘혁명의 투시도’로 불릴 글을 쓴 책표지 뒤 작가의 환한 웃음에 쉽게 동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사는 세상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불평등하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삶에 자격 조건이 있을까? 여성이라야만 알 수 있을까? 여성을 이해하는 남성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을까? 폭력과 불평등한 세상을 깨뜨리는 방법을 혁명이라고 부를까? 작가가 그린 ‘세상 투시도’를 보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그렸던 암울한 회색의 투시도를 다시 보는 기분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자였지만 폭력과 불평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의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국에 있는 에코공동체에 보냈더니 아이는 피부가 검은 아이를 배 왔다. 아버지는 언론사 기자이고 엄마는 외국계 인권단체에 근무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만난 학출이다. 모자란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실패하는 이야기. (하긴)
이 엄마 아빠가 영화모임에 간다. 부부 관계가 영 별로다. 부부 관계가 불편하면 바람을 피운다. 이번에는 아빠가 같은 모임에 있는 엄마의 후배와 그랬다. 아내뿐만 아니라 모임의 사람들 모두 아는 모양이다. (그친구)
초롱이 절필했다. 과거 글쓰기 공부에서 썼던 글을 다시 고쳐 쓴 소설이 성공을 한 후 누군가가 과거 글을 공개해 이중인격 작가로 인식되어서다. 초롱은 (하긴)에서 아빠의 친구 '문'의 딸 이름이건만 벌써 그 애가 이렇게 컸단 말인가? 혹시 엄마가 초롱인가? (이중 작가 초롱)
출퇴근길이면 타는 지하철 안, 승객들을 스캔하며 불안해하는 여자. (여자가 지하철 할 때)
수진과 수미가 나오는 이야기. 밤마다 글을 쓰는 수진, 편애하는 원장과 같이 일하지만 그저 그런 수진. 동거남과 헤어진 수진. 그런 수진이 이제는 글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 (티 나지 않는 밤)
무덤에 묻힌 살인자들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 영아 살인자와 남자들을 연쇄 살인한 살인자가 어떻게 같은 무덤에 묻힐 수 있는가 묻는 이야기 (살인자들의 무덤)
부모가 계를 들어 보내준 성지순례 이야기. 멀리 보내고 안심하는 부모와 부모가 없어 성적 자유를 누리는 청소년의 성 억압과 해방이 주제일지도 모를 이야기. 온통 억압된 성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는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한 상처로 중첩된다. (무릎을 붙이고 걸어라)
부모 부양과 조카 양육의 부담을 안았던 모래 고모와 함께한 사냥 여행지의 하룻밤을 이야기하는 목경이와 언니 무경 이야기. 고모와 언니가 서로 상통하여 낳지 않고도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목경이. 이유를 모른다는 목경이지만 사실 작가가 한 말이니 읽는 나는 짐작해야만 하는 부담감. 부담감의 실제는 남성의 폭력성. 버젓이 떳떳하게 모닥불 곁에서 존재하는 남성의 은밀한 폭력성. (모래 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
짧은 글들이 수록된 작품의 제 나름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렵지요? 공통점이라면 모두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문학평론가 전승민의 해설 말미의 글을 인용합니다.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기에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예술은 표현의 자유에서 출발했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핵심적 가치다. 그러므로 더 많은 안평대전(안전파와 평등파의 싸움)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중략) 문학은 현실을 뒤따라가며 ‘올바르게’ 반영하고 재현하는 기록물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를 재맥락화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보지 못했던 빛과 어둠을 찾아내며, 다가올 미래의 가능태를 그려낸다. 이미 합의된 가치관을 지지하는 ‘안전’한 재현만이 문학일 수는 없다. 시대를 이끌어온 모든 예술은 당대에 이미 불온했다. 소설이 지닌 힘이란 바로 이런 문학적 상상력, 발칙하고 도발적이며 독자들을 불편하고 난처한 처지로 몰아넣음으로써 그 누구보다 동시대 속에서 살아내게끔 추동하는 힘이다. 혁명하는 힘이다. 소설집을 덮고 깨닫는다. 나는 이런 소설을 정말로 기다려왔다. “문학은 자유다.” (347~348쪽)
이해하셨습니까? 글을 읽었다고 서평을 쓰는 것이 때론 고통이기도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고통입니다. 사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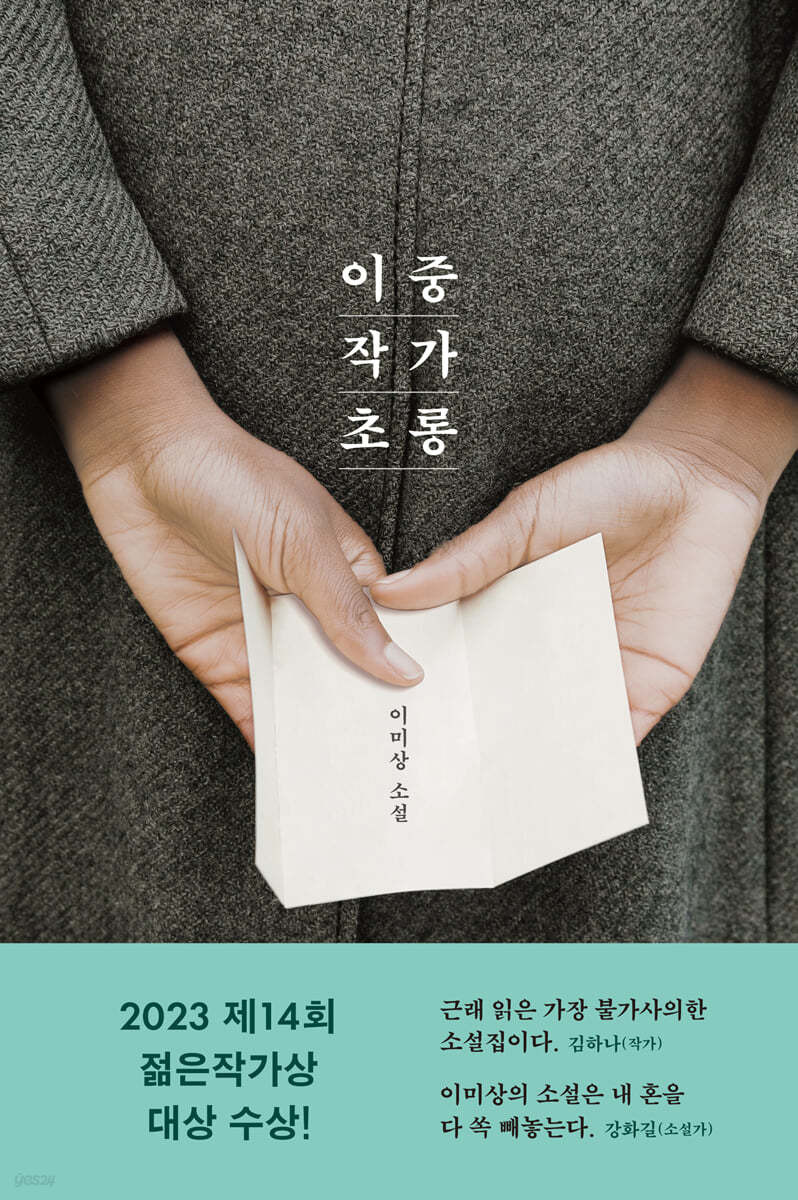
'매일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는 유령작가입니다. 김연수 소설. 문학동네 간행 (6) | 2024.12.13 |
|---|---|
| 한국 현대사 산책1940년대편 2권. 강준만 저. 인물과 사상사 간행 (1) | 2024.12.10 |
| 심여사는 킬러. 강지영 장편소설. 네오픽션 간행 (0) | 2024.11.27 |
| 므레모사. 김초엽 소설. 현대문학 간행 (2) | 2024.11.26 |
| 성소년. 이희주 장편소설. 문학동네 간행 (2) | 2024.11.25 |